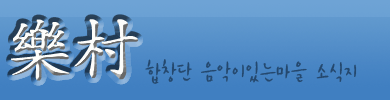1964년
내가 7살 때의 일이다. 젊은 부부가 주인으로 있는 미아리 산동네 집에 대전에서 올라와 세를 살 때인데, 경상도 출신 주인집 부부에게는 갓난 딸이 하나 있었고 당시에 귀하다는 흑백 TV, 전화기가 있었다. 네 식구 우리 집은 어린 내가 보아도 심하게 가난했다. 살림살이는 보잘 것이 없었고 그 잘난 가문이나 혈통은 전쟁 통에 모두 날아간 뒤였다. 지나친 가난은 궁색한 천민 그 자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족풍의 주인집 젊은 아주머니는 나를 좋아했다. 이제 막 태어난 자기 딸을 보여 주며 ‘준철아, 우리 딸 잘 키워 니 주꼬마! 야와 꼭 장가가야 칸데이’를 노래처럼 하신 분이다. 나는 언제나 ‘싫어요! 한 살짜리하고 어떻게 살아요?’ 하고 심술을 부렸다. 아들이 없었던 그 부부는 유독 나를 예뻐했고 몰래 과자를 주기도 했으며 ’보난자‘라는 서부영화를 할 때면 큰 마루에 나를 앉히고 보게 해 주었다.
사건은 초등학교 입학을 얼마 앞둔 겨울날에 일어났다. 주인집 아주머니는 우리 엄마에게 내게 입학식 때 입을 옷을 하나 사주라고 내가 보는 앞에서 돈을 준 일이 있었다. 우리 엄마는 그 돈으로 두 벌을 사서 형과 나를 입혔다. 나만 사줘도 될 텐데, 큰아들이라고 형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간 것이었고, 그 사실을 잘 아는 나에게는 오기가 치밀었다. 3년 전 형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형에게만 옷을 사주고, 주인집 아주머니가 나를 위해 준 돈으로는 왜 형에게까지 옷을 사준단 말인가? 더구나 내 옷보다 형의 옷이 훨씬 좋고 비싸지 않던가? 심사가 뒤틀린 나는 아침에 옷을 입고 나자 설매 타러 가자고 형을 꼬드겼다. 산동네 언덕에는 눈이 오고 난 후라서 미끄럼 타기에 안성맞춤이었고, 나는 형과 함께 오전 내내 그 얼음언덕에서 미끄럼을 타며 형의 옷을 더럽히려고 갖은 머리를 다 굴렸다.
점심때가 되어 집에 돌아갈 때는 형과 내가 입은 옷은 이미 새 옷이 아니었다. 아니나 다를까 집에 도착하자마자 둘 다 엄마한데 죽도록 맞았다. 귀하게 산 새 옷을 더럽혔으니 화가 나기도 하셨을 것이다. 나는 같이 혼나면서도 짐짓 고소해했다. ‘거봐라 나만 사줬으면 이런 일 없지 않았느냐’는 논리였다.
엄마는 화가 덜 풀렸는지 둘 다 홀딱 벋기고 마당 펌프 꼭지 주변에 물이 얼은 곳에 둘을 맨발로 벌을 서게 했다. 차가운 얼음이 발바닥에 닿으니 시리기보다는 아팠다. 형은 발을 동동 구르고 손을 싹싹 비비며 ‘ 엄니 잘못 했시유. 한번만 용서해 주시유!!’ 하며 빌기 시작했다. 순간 나는 갑자기 나만의 컨셉을 빼앗기고 말았다. 내가 먼저 빌어서 나만 방에 들어가고 형은 남게 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이다. 같이 빌 수는 없는 일이었다. 형과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 나로서는 말없이 벌을 받는 길이 엄마한데 잘 보이는 길이라 판단되어 덜덜 떨면서도 그대로 얼음위에서 벌을 달게 받았다. 하지만 나의 계산은 빗나갔다. 5분쯤 지나자 엄마는 문을 덜컹 열더니 ‘준권이는 들어오고 준철이는 그냥 서있어라!! 독한 노무 쌔키...!! ’ ...

합창 지휘자를 위하여
카테고리
지은이
상세보기
치사한 형은 면죄부를 받고 나만 독한 놈이 되어 얼음판에 남았다. ‘ 이게 말이 되? 옷을 똑같이 사준 것도 불공평한데 벌을 열심히 받는 나는 놔두고 알랑방귀 뀐 형만 살려주다니....하지만 어떻게 하나... 정답을 알았으니 지금이라도 빌어? 아니면 여기서 얼어 죽어? ’....
내 발밑의 얼음은 이미 다 녹았다. 유난히 발에 열이 많은 나는 얼음을 녹이고 미지근해진 물에 있었으니 발은 시렵지 않았지만 추위를 많이 타는 맨몸은 역시 괴로웠다.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작은 어깨를 움츠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울고만 있었다. 억울했다....... 엄마가 미웠다....... 그런 엄마에게 복수하는 것은 참는 길뿐이다. 내가 여기서 떨고 있는 게 엄마도 편치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방문이 열렸다.
‘ 너 잘못 했어 안했어?’
‘...........................’
‘저 독한 노무 쌔키가... 그래도 잘못했다고 안 비네!!....’
‘..................................’
나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도무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구원을 받을 텐데 가슴에서 뿜어져 나오는 억울함이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거기서 얼어 죽어!! ’
방문은 다시 닫혔다. 엄마도 울고 계셨다. 나는 이렇게 죽는구나 생각했다.
‘어...엄 ... ..니............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몸은 점점 감각이 없어지고 있었다.
이때 주인집 마루문이 열리고 아주머니가 울면서 뛰어 나왔다.
‘ 아이고마 머스마들이 다 그렇지 ... 그렇다고 귀한 알 죽일라 카네 !! ’
그 아주머니는 담요로 나를 싸서 달랑 안고 주인집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주머니는 나를 꼭 안고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나도 울었음에도 아주머니에게서 나는 향긋한 냄새가 좋았다. 우리 엄마에게서는 한 번도 나지 않았던 향기로움. 그게 화장품 냄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는 그 아주머니 몸에서 나는 향기인줄만 알았다.
‘ 아! 이 아줌마가 나의 엄마였으면 좋겠다. 가난과 무식이 찌든 우리 엄마에 비하면 이 아주머니는 천사와 다름없지 않은가? ’ 따듯한 물을 먹이고 아랫목에 나를 누이고 내 볼에 자신의 볼을 대고 하염없이 울기만 하였다. (나중에 안 이야기지만 이 아주머니 첫아들이 2년 전에 병으로 죽었다한다.)
이후 주인집 아주머니와 우리 엄마는 모종의 배팅(아마 집세)을 하였고 나는 엄마에게 가중처벌을 받지 않고 집으로 돌아 올수 있었다. 이 천사 아주머니가 정릉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도 나를 데려가 키우겠다고 했지만 질긴 핏줄의 연을 끊을 수 없었던지 나는 죽어도 싫다고만 했다.......
2009년
지휘를 하면서 나는 지금도 고집을 피운다. 지천명이 되었건만 음악에 관한 고집은 그 껍질부터 알맹이까지 더 견고해지기만 한다.
지휘자는 무색무취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평안을 주지 못한다. 당근 자기주장이 강하다.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리는 음악(Inner hearing)이 지금 이 자리에서 펼쳐지지 않으면, 그 간극이 크면 클수록 미쳐서 길길이 뛴다. 정답을 가르쳐 줘도 학생이 오답만 찍으면 머리통 터지면서 돌듯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음악이 현실 속에서 울리면 역시 미친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 저 인간 왜 저래? 왜 저만 잘났다고 난리 브루스야?.’라고 말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휘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독선적 행동을 수반한다. B. Walter는 ‘ 강철 같은 자기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휘자이다’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어느 면에서 지휘는 ‘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작업이다’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모차르트가 성인이 되어서도 큰소리가 나면 자주 울었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를 정서적으로 ‘미쳐간다’라고 판단하였지만 우주 저 끝으로부터 울려오는 음악을 듣는 그로서는, 그 예민한 귀로서는 의미 없는 큰소리가 참을 수 없는 흉기가 된 것이 분명하다.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지휘자.......타인에 대해서든, 자신에 대해서든 너그럽지 못한 지휘자....... 이것만으로도 힘겨운 십자가를 짊어진 존재에 다름 아니다. 음악을 하는 한, 더 나은 소리를 위해 그 고집을 관철시키기 위해 살인적 인내를 하고 있는 지휘자.......
그래서 나는 가끔 내가 가엽다.
7살 때의 나처럼.......